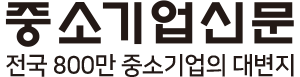정부 '탈원전 폐기' 반영…원전 생태계 활성화 전망

정부가 전력 수급을 위해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로 짓고 2035년에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단 계획을 공개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계획했던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이에 더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어서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13년 11개월(167개월)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부터 당장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나선다면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으로,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전기본 총괄위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에 0.7GW 분량을 할당했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 수준이다.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환경영향 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된다.
다만 대형 원전 추가 건설과 SMR이 가동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사회적 합의에서 어려움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가운데 천지 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진 원전보다 천지 쪽의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 보고 과정에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의 반발도 과제다.
이를 넘어서고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원전 생태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를 10년간 2조9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 외에도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의 보조기기 계약에도 10년간 2조원가량의 발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