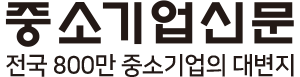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 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천 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 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살펴보면, 2017년 6,470원(7.30%), 2018년 7,530원(16.38%), 2019년 8,350원(10.8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1%),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0,030원(1.72%)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상률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2017년에 비해 32.9%나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급여력이 바닥난 소규모 기업들이 피해가 급증하였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 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거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7차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피로감만 누적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람의 지급여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급여력을 넘어서는 시급 인상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한계기업이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치적 명분론에 매몰되어 기업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한계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명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통상 비용 인상 효과는 누적되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를 생산성 증대로 풀지 못하면 기업의 대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품가격에 전가하는 방법인데 이는 가격결정력이 있는 독과점기업이나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추가적인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안이고 후자는 실업 대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자 양산은 실물자산이 없는 사람이나 임금근로자,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 지배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은 단순하다. 전사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거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방안 외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다. 하지만 전자인 전사적인 비용 절감은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사내 분위기를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생산성 향상은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정부는 제조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으나,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더욱 종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2023년 11월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자금, 인력, 연구개발(R&D) 등 기능별로 분절된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 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장관이 바뀌더라도 중소기업 핵심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생산성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내건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하고 생산 현장의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저수익, 저임금, 우수인력 유입억제, 저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