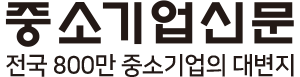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1조' 클럽, 병원 의존도 높아…판교 신규 공장으로 美 마티카와 투트랙

매출 ‘1조원’을 앞두고 있는 차바이오그룹이 세포치료제(이하 CGT) CDMO로 신성장 동력 마련에 나서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거대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 전 시장 선점을 추진 중이다.
13일 차바이오그룹의 지주사격인 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690억원으로 전년 동기 7132억원 대비 약 558억원, 7.8%가 증가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95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조 클럽도 가능하다.
사업부서별 매출 비중을 보면 1조 클럽 달성에는 병원 사업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병원 매출은 전체 매출의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19년 55% 이후 상승세다. 차바이오텍 매출액은 2019년 연간 5346억원에서 지난해까지 4년 간 약 4200억원이 증가했고, 이중 병원매출 2976억원에서 5744억원으로 2800억원 가량 늘었다.
차바이오그룹은 병원사업을 대신할 신사업으로 CGT CDMO 사업을 점찍었다. 2022년부터 1100억원 투자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생산시설과 바이오뱅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 문을 연다.
향후 CGT CDMO 시장의 성장세는 여느 분야보다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CGT CDMO 시장 지난 2019년 15억2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31% 성장해 2026년 101억1000만 달러(약 12조8000억원)로 커진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항체치료제 CDMO 시장이 크다. 2023년 기준 항체치료제 CDMO 매출은 127억9000만 달러로 전체 CDMO 매출의 약 65%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만 보자면 2029년까지 항체치료제 CDMO는 8.5%, CGT CDMO는 33.1%가 예상된다.
시장이 훨씬 큰 항체치료제 CDMO 시장 공략을 위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차바이오그룹 보다 훨씬 큰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4월 5공장 가동 시 총 78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CDMO사업 확대를 위해 1차 투자금으로만 1조5000억원을 계획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20만 리터 규모 생산시설을 갖출 것이라 밝혔었다.
두 업체는 향후 CGT CDMO로도 시장 확대를 검토 중이기에 차바이오그룹으로서는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른 진출이 필요하다. 올해 1월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CGT 사업 진출도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최근 투자설명회를 통해 "추후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 CDMO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차바이오텍은 현재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 연간 500리터 규모의 CGT CDMO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티카 2공장을 통해 2000리터로 늘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CGT CDMO 투자를 시작하면 규모 경쟁은 따라잡을 수 없다. 실제로 항체의약품 CDMO 시장은 업계에 벌써부터 공급과잉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비교해 차바이오그룹은 세포치료제 신약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빠른 CDMO 시설을 갖춘 후 세포치료제 신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우선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임상 1상이 종료된 고형암 면역세포치료제(CBT101)는 올해 6월 NK(자연살해)세포치료제로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 뇌졸중 치료제(CordSTEM-ST), 무릎관절연골결손 치료제(CordSTEM-CD), 퇴행성 요추 추간판 만성 요통 치료제(CordSTEM-DD)에 이어 최근 조기난소부전 치료제(CBT210-POI)까지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 차바이오랩은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어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 CDMO 사업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세 가지 허가 국내 최초로 취득하며 일찍감치 CGT CDMO 사업을 준비했다.
미국 자회사 마티카가 이미 CGT CDMO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차바이오그룹으로서는 신규 생산시설 구축 후 가장 어려운 첫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올해 10월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 바이오텍인 사이토이뮨 테라퓨틱스, 몽구스 바이오에 이어 12월 트레오비르와도 CD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업계 전망대로 CGT CDMO 시장이 성장할 것이냐다. 2020년 이후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건수는 미국 20건, 유럽 11건, 일본 13건, 한국 4건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유망분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실제 신약 개발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는 낮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생산이나 테스트 제품 생산 등에도 CDMO는 필요하기에 당장 신약 출시를 통한 매출 보다는 테스트 단계 매출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차바이오그룹 관계자는 "Cordstem은 탯줄유래 줄기세포, CBT101은 NK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다"며 "2019년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 설립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에 CDMO 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CGT의 핵심 원료인 바이럴 벡터(viral vector) 생산, 레트로바이러스·렌티바이러스·아데노연관바이러스 등의 관련 자체 플랫폼 보유, 2023년 자체 개발 세포주 개발로 바이럴 벡터 생산 효율 향상, 바이럴 벡터의 바이러스 캡시드(capsid) 분리 분석법을 자체 개발을 통한 고객사에 합리적 비용으로 정확한 데이터 제공 가능 등 차바이오그룹이 CGT CDMO에서 타사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