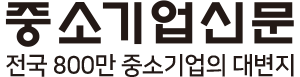모기업·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희석…韓 중복상장률 18%

모기업과 주력 자회사가 함께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국내 증시 고질적 저평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돼 밸류에이션을 깎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오너가에게 중복상장은 매력이 크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모으면 오너가의 지분이 대거 희석되지만,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배력 변화 없이 외부 자본을 끌어와 그룹의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규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상장심사를 엄격히 하고 물적분할 시 기업이 주주보호 방안을 지배구조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등 '연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면서 IPO를 강행할 길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법인은 10년 이상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업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인도 사업부문 분리 상장은 LG전자로 갈 투자자금 수요가 줄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사로 유입될 자금이 지배주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인도와 한국 시장의 투자자가 달라 자금 유출 우려가 없고, 인도 IPO가 100% 구주매출(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 매각) 형태인 만큼 조달 금액이 본사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2월 상장한 IT 서비스 계열사 LG CNS의 코스피 상장 때도 중복상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지주사 LG가 거느린 마지막 대형 비상장사인 LG CNS마저 상장하면서 LG 주식이 사실상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현재 LG는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HS애드 등 주력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상태다. LG CNS까지 따로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이 LG 주식을 살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LG의 주가는 LG CNS의 상장 준비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초 7만9000원대에서 지난 18일 6만3200원으로 20% 하락했다. LG CNS 상장일인 올해 2월 5일 주가 7만2100원과 비교하면 12% 이상 내린 수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LG그룹은 2022년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떼어내 재상장하면서도 주주이익 침해 파문이 컸고 이 문제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넣자는 논의를 촉발했다"며 "결과적으로 중복상장 관련해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게 돼 사측(LG그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도 중복상장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이차전지 소재 조직을 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상장했다. 이어 SK온·SK엔무브의 상장도 잇달아 추진해 모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SK엔무브의 상장 예비 심사 전 협의에서 주주 보호 방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IPO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산그룹도 논란이 적지 않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월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체코 증시에 상장했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역시 별도 상장됐고, 두 회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 합병을 추진한다는 물의까지 빚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해 주주가치를 제고한 사례가 있다. 동원그룹 지주사 동원산업은 최근 상장 자회사 동원F&B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상장 폐지키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도 2023년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를 상폐하고 그룹 내 상장사를 지주사 1곳으로 단일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