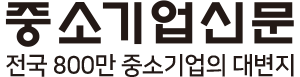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한번은 (코스트코 창업자 제임스 시네갈에게) 가서 말했죠. ‘우리는 이 핫도그를 1.5달러에 팔 수 없다,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핫도그값을 올리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2018년 4월 당시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크레이그 젤리넥이 지역 상공회의소 오찬 때 들려준 일화다.
코스트코에서는 음료수 한 잔을 곁들인 핫도그를 1.5달러(한국에서는 2000원)에 먹을 수 있다. 젤리넥은 그걸 1.75달쯤으로 올리는 건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웬만큼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은 여전히 많이 사 먹을 터였다. 하지만 창업자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들은 코스트코 하면 1.5달러짜리 핫도그를 떠올리지 않겠는가.
젤리넥의 해법은 납품받던 핫도그를 자체 생산해 원가를 줄이는 것이었다. 코스트코는 자사 브랜드(커클랜드)로 한 해 2억 개 넘는 핫도그 세트를 판다. 놀라운 건 1985년 이후 40년째 가격이 그대로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적어도 4.5달러는 받아야 한다. 이코노미스트지가 1986년부터 산출한 빅맥지수를 보면 그동안 햄버거값도 세 배 넘게 뛰었다.
2022년 9월 당시 코스트코 최고재무책임자(CFO) 리처드 갈란티는 핫도그 콤보 가격을 “영원히” 묶어둘 거라고 말했다. 후임자인 게리 밀러칩도 지난해 5월 “나 역시 1.5달러 핫도그 가격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해 2500억 달러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핫도그 세트 하나의 가격을 이토록 신성시하는 까닭은 뭘까?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단순하다. 이 회사는 무엇보다 품질 좋은 상품을 최저가에 판다는 걸 내세운다. 불만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주겠다고 큰소리친다. 40년째 똑같은 핫도그 값을 고집하는 건 그에 대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상징적 정책이다. 핫도그 콤보의 채산성은 정확히 공개된 적이 없다. 하지만 그 가치에 만족하는 고객이 입소문을 내는 효과까지 따져보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6월 3일 현재 코스트코 주식시가총액은 4687억 달러에 이른다. 글로벌 유통업체 중 아마존과 월마트에 이어 ‘넘버3’다. 이 회사 주가는 한 해 이익의 60배 가까운 수준이다. 주가수익배율(PER)이 30배 남짓한 애플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지난 분기(5월 11일까지 12주간) 매출은 트럼프 관세의 충격을 받았을 법한데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었다. 주당 순익은 13% 증가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치투자를 이끌었던 찰리 멍거는 1997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코스트코 이사회에 있었다. 그가 보기에 코스트코는 “오지게 완벽한 회사”였다. 1999년부터 이 회사에 투자한 버크셔는 2020년 주가가 300달러대일 때 모두 팔아버렸다. 그 주가는 올해 들어 1000달러를 넘어섰다. 돌이켜보면 너무 일찍 판 것이다. 그에 대해 워런 버핏은 “아마도 실수”였다고 했다.
지구촌에 905개의 매장을 열고 있는 코스트코는 1983년 제임스 시네갈이 제프리 브로트먼과 함께 창업했다. 10년 후에는 시네갈의 친정이기도 한 프라이스클럽과 합쳤다. 창고형 할인매장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코스트코는 기존의 창고형 모델에 회원제를 도입해 성공했다. 연회비를 내야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났다.
작년 말 코스트코 회원은 1억3680만 명에 이른다. 8월 말에 결산하는 이 회사의 2024 회계연도 매출은 2544억 달러, 영업이익은 92억 달러였다. 한 해 동안 회원들이 낸 수수료(48억 달러)가 영업이익의 절반을 넘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는 데 큰 몫을 했다. 회비를 낸 고객들은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구매한다. 품질과 가격에 만족한 이들은 회원카드 갱신율이 90%를 웃돌 만큼 충성 고객이 된다.
코스트코의 매출총이익률은 월마트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마진은 연회비로 벌충한다. 마진을 낮출수록 값을 내려서 더 많이 팔 수 있다. 선택지는 확 줄였다. 월마트는 12만 가지(샘스클럽은 7000가지)나 되는 품목을 판다. 코스트코가 파는 품목은 3800가지 정도다. 품목을 줄일수록 품질에 집중할 수 있다. 품목당 구매량을 늘려 협상력을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 재고 관리가 단순해져 운영비도 줄어든다.
코스트코는 고객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충성을 얻는 데도 남다르다. 소매업계의 연간 이직률은 60% 정도다. 코스트코의 경우 8%에 불과하다. 대우를 잘 해주는 만큼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게 한다. 내부 승진 기회도 많이 준다. 작년 1월 CEO가 된 론 바크리스는 1982년 열일곱 살 때 지게차 운전기사로 프라이스클럽에 들어왔다.
코스트코는 어떻게 지금 같은 사업 모델과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연원을 찾다 보면 솔 프라이스(1916~2009)라는 특이한 기업가를 만나게 된다.
장경덕 작가·번역가
33년간 저널리스트로서 경제와 기업을 탐사했다. 『부의 빅뱅』 『애덤 스미스 함께 읽기』 『정글 경제 특강』 등을 썼고 『보수주의』 『21세기 자본』 등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