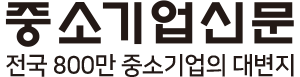신약 파이프라인 ADC 집중…차세대 이중항체 ADC 개발도 예고
동아시아 조준…발병률 높은 혈액암에 효과적·공급망 이점 기대

셀트리온이 신약 사업을 ADC(항체-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세대 ADC 기술로 주목받는 '이중특이성 ADC(Bispecific ADC, 이하 bsADC)' 개발도 예고해 업계 관심이 주목된다.
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바이오시밀러 41개를 출시로 목표로 한다. 지난 1일에는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44'가 유럽 임상3상 계획을 승인받아 포트폴리오 확장이 순항하는 모습이다. 시밀러 사업의 호조를 통해 상반기 매출 1조803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원가율도 개선해 영업이익은 3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신약 사업은 확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셀트리온이 허가 받은 바이오신약은 국내 출시된 '렉키로나'와 미국에 출시된 '짐펜트라' 2종뿐이다. 이 중 짐펜트라는 램시마SC(램시마의 피하주사제형)와 같은 약물이지만, 제형변경 차별성을 인정받아 신약으로 허가 받았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첫 R&D(연구개발) 행사를 개최하고 신약 개발 현황과 전략을 공개했다. 행사 주제는 ADC로 정해져 관련 파이프라인이 집중 소개됐다.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핵심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은 ADC 기술이 적용됐다. 총 3종의 ADC 신약이 발표됐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CT-P70'은 지난 7월 위암 환자의 첫 투여를 통해 임상1상을 개시했다. 오는 2030년 위식도암 2차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CT-P71'은 1상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을 획득해 초기 데이터 기반 Nectin-4 과발현 고형암에서 적응증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며, 'CT-P73'은 암세포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 특정 조직인자를 타깃하며 이달 IND 승인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bsADC 개발 계획도 밝혀져 주목 받고 있다. 기존 ADC는 하나의 단일클론 항체와 세포독성 약물(페이로드)를 링커로 연결해, 항체가 암세포에 도달하면 약물이 터지는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 bsADC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적을 공격하는 이중특이성 항체를 사용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개발 중인 1554개의 활성 ADC 중 bsADC는 211개로 약 14%에 불과하다. 지난해 독일 BioNTech가 Biotheus를 인수하며 이중특이성 ADC 개발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해당 분야 관심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셀트리온은 아직 bsADC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현재 전세계 bsADC의 84%가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 진입 타이밍은 양호한 편이다.
주목할 점은 bsADC의 최초 타깃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라는 점이다. 유럽제약리뷰에 따르면 세계 최초 bsADC 규제 승인을 위해 미국과 중국 제약사가 경쟁 중이다. 개발 후기단계에 접어든 미국 BMS(Bristol Myers Squibb,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와 중국 상하이JMT바이오테크놀로지(Shanghai JMT-Bio Technology)를 비롯한 총 4곳의 제약사는 중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암젠(Amgen)은 일본 시장을 겨냥 중이다. 반면 미국에서 개발 중인 가장 앞선 bsADC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2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아시아 진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혈액암과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중특이항체는 특히 혈액암에서 높은 효능을 보인다. 혈액암은 혈액세포·골수·림프 등에 생기는 암으로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이 대표적이다. 동아시아는 고령인구 증가 추이 등의 이유로 혈액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혈액암은 10만 명당 44명꼴로 발병했으며, 이는 이전 5년 대비 환자 수가 19.7%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셀트리온도 초기에 아시아 시장을 타깃해 bsADC를 개발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높고, 임상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도 국내 제약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약 사업에서는 공급망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짐펜트라의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도 복잡한 유통망·느린 PBM 등재 절차 등의 이유로 분석된다. 상반기 짐펜트라의 매출은 346억원으로 연간 매출 목표치의 10%에도 못 미쳤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 확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지역별 총 매출에서 유럽과 북미의 비중이 크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북미 매출은 1545억원으로 전반기 대비 254% 성장했다. 유럽은 22.7% 증가한 9757억원으로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시아 매출은 전년 대비 263억원 줄어든 1164억원에 그쳤다. 다만 내부 매출을 제외한 순매출은 증가세를 보여 성장 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bsADC를 비롯한 신약으로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외형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