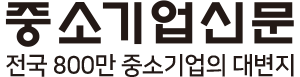中 품목허가 신청…"주가에 중국 시장 가치 반영 안 돼"
편두통·경부근긴장이상 등 치료 목적 적응증 확대 기대

대웅제약이 톡신 '나보타'의 중국 상륙을 본격화하며 저평가된 주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100유닛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앞선 2021년 12월 중국에 나보타의 품목허가를 한 차례 신청했지만, 회사 내부 종합평가 및 사업 개발 전략 조정에 따라 올해 7월 자진 철회했다. 이후 품목허가 신청자료 보완을 거쳐 이번에 재신청했다.
상반기 나보타의 매출은 1153억원으로, 이미 전년 매출의 62%를 달성했고 전반기 대비 28%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나보타의 연매출이 2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전체 매출 중에서도 16.9%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나보타의 성장이 향후 외형을 키우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나보타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웅제약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이다. 지난 2019년 5월 중순 나보타의 출시 당시 16만원대이던 주가는 2020년 말 27만55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고점 없이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4월 초에는 11만3300원으로 연내 최저점을 기록했다. 17일 오전 10시 1분 기준으로는 14만700원이다. 이는 증권가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웅제약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돼 목표 주가를 20만원~21만원으로 제시했고, 최대 25만원까지 의견 제시를 하기도 했다.
지난 2분기 나보타는 미국에서 출시 이후 최초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8월 말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 매출이 5970만 달러(한화 약 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추정치(6690만 달러)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에볼루스는 "미국 톡신 수요가 2분기 급격히 둔화되는 등 소비자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주보는 14% 점유율을 유지하며 시장 대비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긴 했으나, 올해 초 에볼루스가 필러를 론칭해 주보와 번들판매를 시작하며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미국 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시장 진출 폭도 넓히는 중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브라질에서 1800억원, 태국에서 738억원 규모의 나보타 수출 재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쿠웨이트와도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5개국에 나보타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중국 진출이 이뤄지면 가치 평가가 높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SK증권은 "중국 나보타의 가치는 현재 동사의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톡신 시장은 미국에 이어 단일국가로는 전세계 2위이며, 올해 시장 규모는 126억위안(2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 톡신 기업은 휴젤이 유일한데, 미국·유럽 대비 가격이 저렴하며 중국 현지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품질을 앞세워서 공략 중이다. 나보타 역시 이와 비슷한 전략을 통한 수요가 기대된다.
중국 품목허가의 적응증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대상 눈썹주름근·눈살근과 관련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으로, 미용 목적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톡신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향후 치료 적응증 확대도 기대된다. 나보타는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사각턱 개선 임상3상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미간·눈가주름 뿐만 아니라 사각턱,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플 경련 등 치료 목적의 적응증도 승인 받은 상태이다.
미국에서도 적응증 확대를 꾀한다. 대웅제약은 미용과 치료 적응증 관련 파트너사를 다르게 두고 있는데, 각각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담당한다. 나보타는는 미간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5개의 치료 적응증 임상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온바이오파마는 나보타를 ▲삽화성 편두통 ▲만성 편두통 ▲경부근긴장이상 ▲위무력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향후 중국에서의 적응증 확대에 대해서 대웅제약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