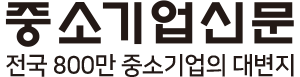대리운전 유선콜만 규제…“앱 중심 개편된지가 언젠데”
강제력 없는 권고 그쳐…사업조정 실효성도 5% 그쳤다

“대리운전업에서 카카오, 티맵이 못 하는 건 유선콜뿐이에요. 앱은 전혀 제한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난 28일 기자가 만난 대리운전사의 말이다.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앱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앱으로 배차되는 상황에서 전화콜 제한을 해봐야 사실상 무의미해서다.
대리운전업은 지난 2022년 5월,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그러나 제한된 영역은 ‘전화 유선콜 중개’로 한정됐고, 현재 시장의 상당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중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대기업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당시 대리운전 시장 구조는 전화 유선콜 80%, 플랫폼 앱 20%였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전국 호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티맵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플랫폼 기반 호출 구조로 산업이 재편된 상황에서 기존의 유선콜 중심 규제는 현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통 플랫폼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은 이용자 4000만 명, 티맵은 2000만명 수준”이라며 “이용자 기반에 더해 원가 할인, 현금성 프로모션까지 쏟아붓는데 소상공인이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 당시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등을 대기업 측에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약받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일부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조정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조정 신청은 186건에 달했지만, 실제 조정 권고가 내려진 사례는 10건(5.4%)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 주요 업종에서도 조정권고율은 5% 내외에 머물렀다. 사업조정이 자율 조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현장에서는 “강제권이 없는 제도에 기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유통 플랫폼위원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별도의 실효성 있는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5년 넘게 계류 중이다. 입법 공백 속에 플랫폼 기반 대기업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기존 규제 제도는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