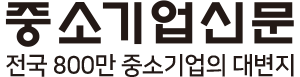이근 한국경제학회장, HDI CEO하계포럼서 트럼프 시대 변화 해부

“트럼프 1.0 시대가 탈세계화였다면, 트럼프 2기는 탈세계화에 더해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등 가치 중심주의의 종말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와 2기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 회장은 21일 강원도 강릉시 탑스텐호텔에서 개막한 ‘HDI CEO 하계 포럼’ 기조강연에 나섰다. HDI 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이 포럼은 대한민국 각계 CEO들이 지혜를 나누는 자리로, 올해로 42회를 맞았다.
그는 기조강연 ‘세계 지정학적 변화와 한국의 대응: 트럼프 2.0 시대의 충격과 전망’에서 지난 6개월간의 트럼프 2기 분석과 중국의 현황,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짚었다.
◆트럼프 2.0, 한국 직접 타격
이 회장은 트럼프 2기 시대를 “탈세계화이자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적 자유주의 속에서 중국이 독주하고 미국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결국 트럼프 집권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 6개월간의 관세 전쟁 끝에 타결된 합의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받아 최악을 피했으며, 자동차는 불리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는 최혜국 대우를 얻어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의 공세는 중국을 겨냥해 한국에는 이득이었으나, 2기는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줄고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짚었다.
◆트럼피즘의 모순, 유럽·일본의 부상으로 이어져
이 회장은 트럼피즘의 근본적 모순도 지적했다. 미국 제일주의와 대중국 견제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제일주의는 유럽과의 갈등을 심화시켜 대중국 전선이 약화됐으며, 이는 미국·중국·유럽의 ‘천하 삼분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매력도가 낮아진 대신 GDP 규모가 미·중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을 공략해야 하며, 일본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한국의 조립 산업의 시너지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장 둔화됐으나 건재한 중국, 새로운 활용법 필요
이 회장은 중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미국 추격 속도는 둔화됐지만 미·중 경쟁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동시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추세를 보임에도, 민주화 지체 등으로 미국을 능가하기는 요원하다는 진단을 함께 내렸다.
그는 "중국은 최근 10년간 미국과의 GDP 격차를 약 1.2%p 줄였는데, 현재 격차는 37%p에 달한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중국 기업의 임금 상승과 경쟁력 강화로 ‘탈중국’ 흐름에 있었고, 이는 미국 투자 확대를 불러왔다. 그 결과 한국은 유럽 전체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나,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으로 새로운 부담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중국이 저임금 생산기지였다면, 앞으로는 생산과 연구개발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중국 내 제조 후 제3국 수출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경제의 3대 공동화 충격, 극복 위해 다극화·세계화 필요
끝으로 그는 한국이 처한 3대 공동화(空洞化) 위기를 경고했다. ▲미국발 공동화(대미 관세로 한국 내 생산 감소) ▲중국발 공동화(중국 내수 침체로 저가 물량 유입) ▲국내발 공동화(인구 감소·고령화로 성장 둔화)가 그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혁신 생태계 구축 ▲대기업·중소기업 간 역량 공유를 통한 내재화·리쇼어링 ▲소부장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탈세계화 시대에는 가장 세계화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그는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장,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세계적 경제학자다. 저서로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 『디지털 사회 2.0』,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