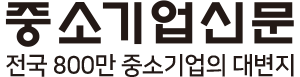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참하고 일을 계속 한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특별수당을 지급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인 노조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와 같은 판단 하에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는 A사 노조는 2023년 10월부터 약 한 달가량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회사는 파업 종료 한 달 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일부 근로자에게 투입시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에 돌입했다.
사측은 "일부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시급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과다한 보상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파업 시작 때 낸 입장문에서 파업으로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노조 가입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파업 전에는 4조 3교대로 1일 8시간 근무했는데, 파업 이후에는 2조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무를 하게 된 점, 대체 근무자들의 미숙한 숙련도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일부 근로자들이 증가한 노동량에 비해 다소 많이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2024년 8월 추가 파업을 할 당시 이탈자가 11명이 발생한 점을 볼 때 특별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가 파업은 특별수당 지급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 실시됐다"며 "11명의 이탈자가 특별수당으로 인해 동참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